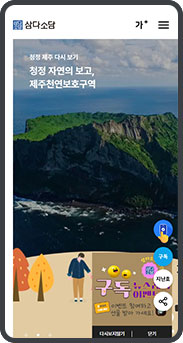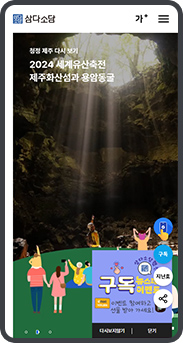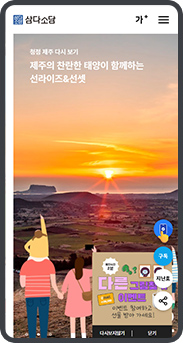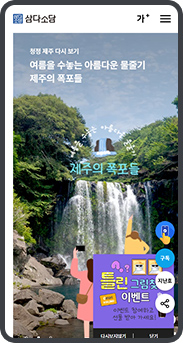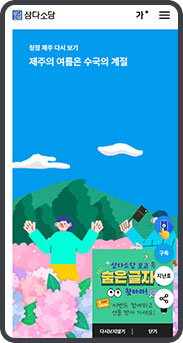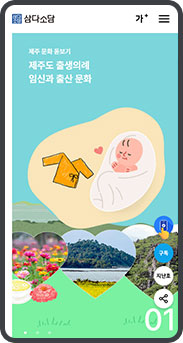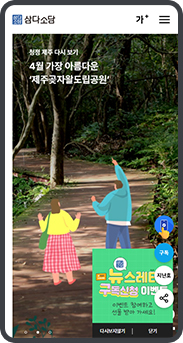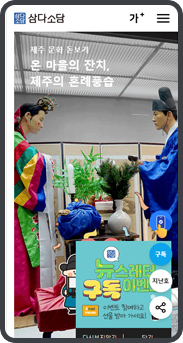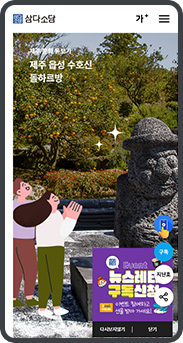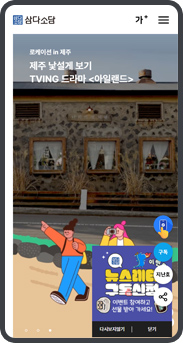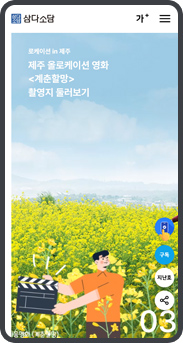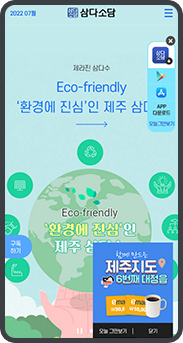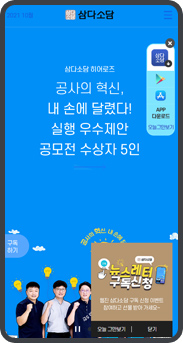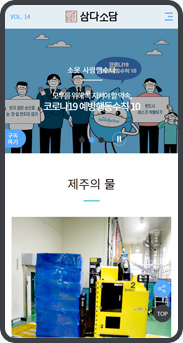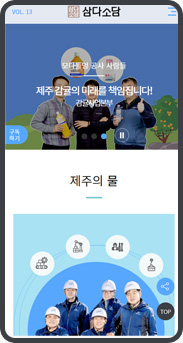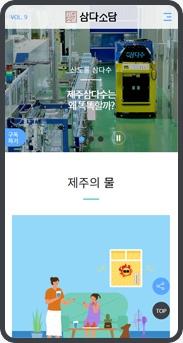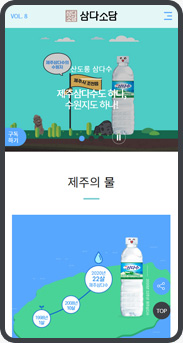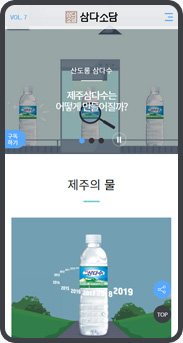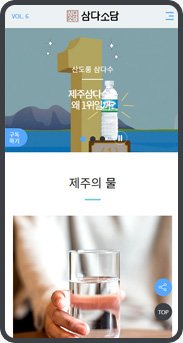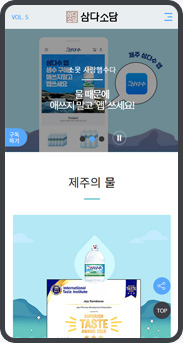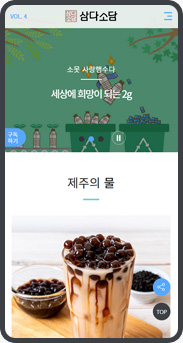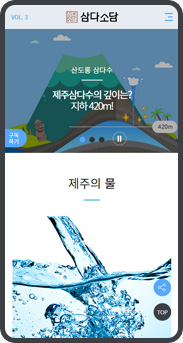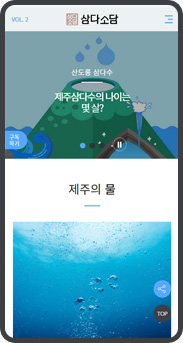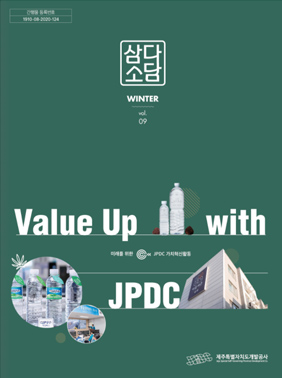보기
청정 제주 다시 보기
- 오름의 여왕, ‘다랑쉬오름’을 만나다
- 제주에는 무려 360여 개에 달하는 오름이 있다. ‘오르다’를 뜻하는 오름은 부드러운 곡선의 미학을 간직한 채 정상에 오르면 보이는 시원한 분화구, ‘굼부리’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이 중 ‘다랑쉬오름’은 특유의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오름의 여왕’이라 불린다
- 글. 편집실, 사진. 제주관광공사
달이 떠오르는 곳,
‘다랑쉬오름’
‘제주 사람은 오름을 등지고 살다 죽어서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말을 돌보는 테우리들의 삶의 터전 역시 ‘오름’이다. 그만큼 제주인들 삶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오름들 중 높이 솟은 봉우리와 아름다운 균형미로 사랑받고 있는 ‘다랑쉬오름’은 분화구가 달처럼 둥글다고 해서 월랑봉이라고도 한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할망이 치마로 흙을 나르면서 한 줌씩 놓은 것이 제주의 오름인데, 다랑쉬오름은 흙을 너무 많이 놓아 두드러진 탓에 손으로 탁 쳐서 패이게 한 것이 지금의 *굼부리라고 전해진다. 그만큼 굼부리의 모양이 마치 사람이 손으로 빚은 듯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실제 둥근 굼부리에서 보름달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송당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하여,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겨진다고.
‘다랑쉬오름’은 밑 지름 1,013m, 전체 둘레가 3,391m로 비교적 큰 몸집을 가지고 있다. 사면은 돌아가며 어느 쪽으로나 비탈진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산정부에는 크고 깊은 깔대기 모양의 원형 분화구가 움푹 패어있는데, 이 화구의 바깥 둘레는 약1,500m에 가깝고 화구의 깊이는 한라산 백록담의 깊이와 똑같은 115m라 한다.
*굼부리 : 분화구를 뜻하는 제주어


등반시간은 20~30분 가량 소요되는데, 나무계단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부지런히 오르면 수고를 보상해주듯 완벽하게 동그란 형태로 움푹 패인 풍경이 펼쳐진다. 오름 주변으로는 드넓은 밭이 펼쳐져 있는데 돌로 쌓아 만든 밭담과 어우러져 더욱 평화로운 풍광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다랑쉬오름은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고, 사랑받아 왔다. 제주 출신의 강요배 화백은 다랑쉬오름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 형상화한 작품 <다랑쉬>를 비롯해 <우레비>, <다랑쉬오름의 이른 아침> 등 다양한 작품에서 다랑쉬오름을 담았다. 또 제주언론인 출신 김종철 작가는 그의 저서 <오름나그네>에 다랑쉬오름의 아름다움을 “비단 치마에 몸을 감싼 여인처럼 우아한 몸맵시가 가을하늘에 말쑥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물지않은
상처가 남아있는
‘다랑쉬굴’
아름다운 다랑쉬오름에도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다랑쉬오름 아래 있던 다랑쉬마을(월랑동)이 4·3사건 때 토벌대에 의해 마을 전체가 초토화 된 사건이 그것이다. 다랑쉬오름에서 조금 떨어진 평지에는 다랑쉬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벌대를 피해 도망갔던 마을 사람들이 몸을 숨겼던 곳이다. 1992년, 44년 만에 이들의 주검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토벌대가 굴 입구에서 피운 불에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뒤 작은 동굴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솥이며 그릇이며 생활도구가 발견되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든 생을 이어가려던 노력의 흔적인 것이다.

제주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는 다랑쉬굴을 품고 있는 다랑쉬오름. 역사를 반성하고 회상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연관광지를 넘어 제주인들의 삶과 아픔까지 품고 있는 오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삼다소담 웹진 구독취소
[구독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