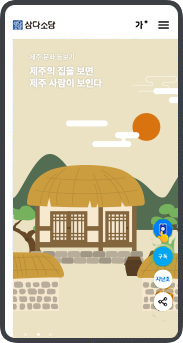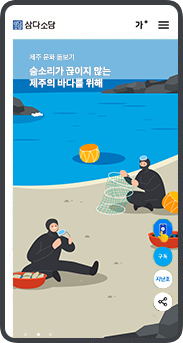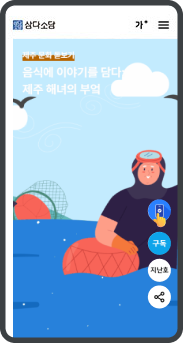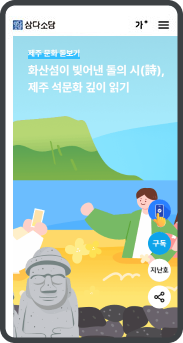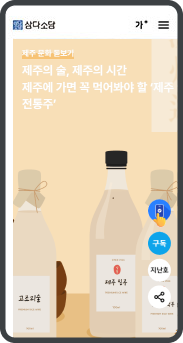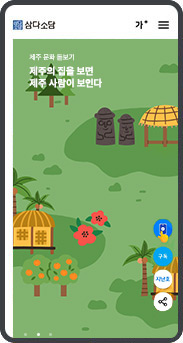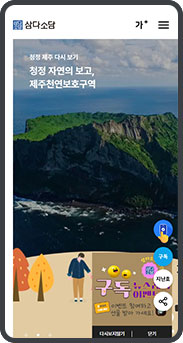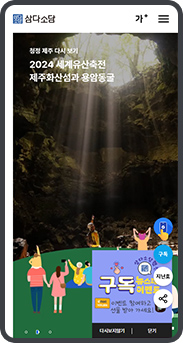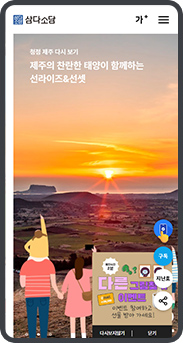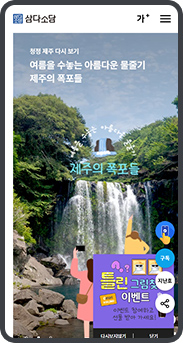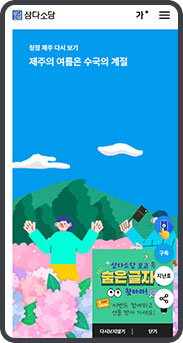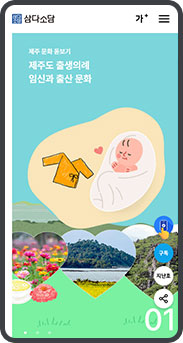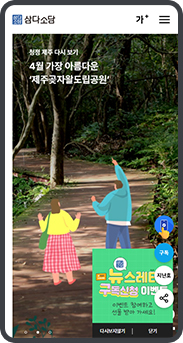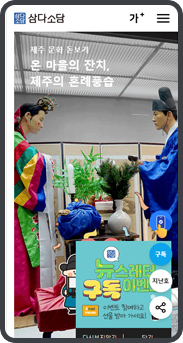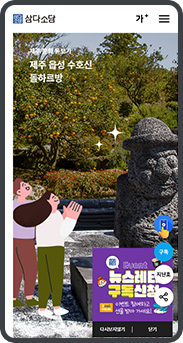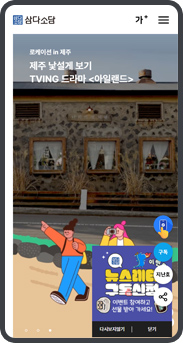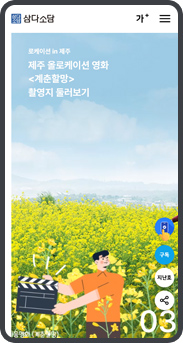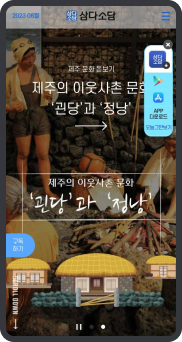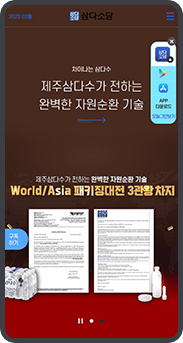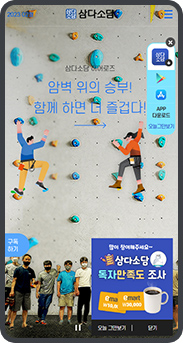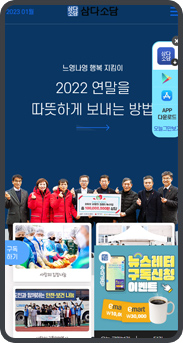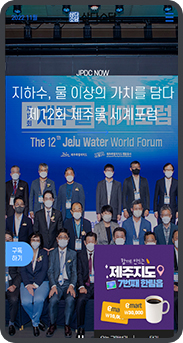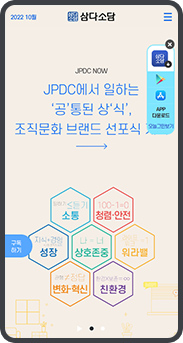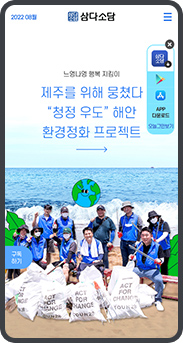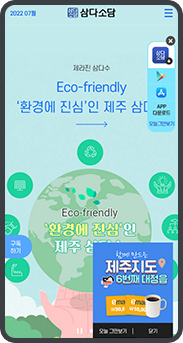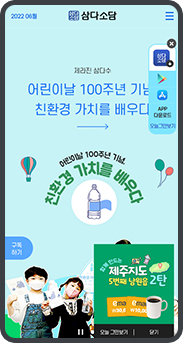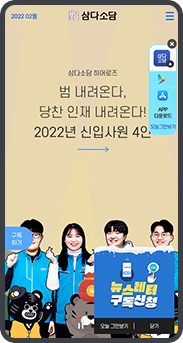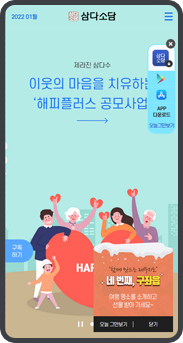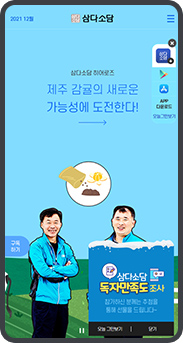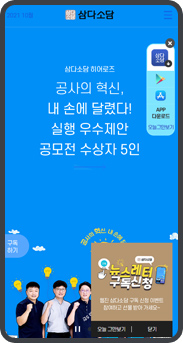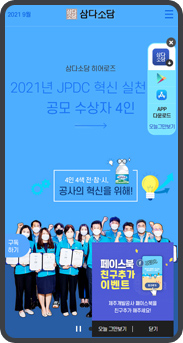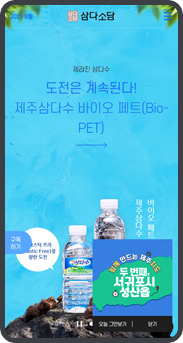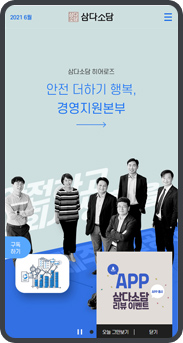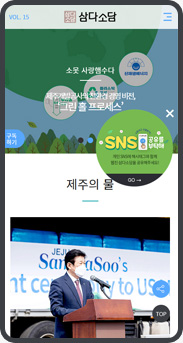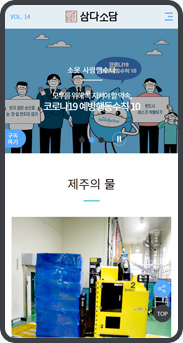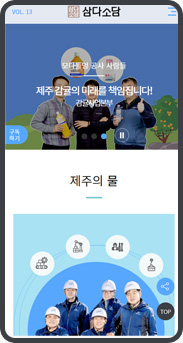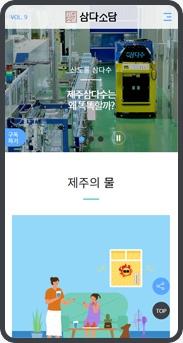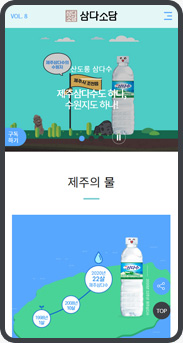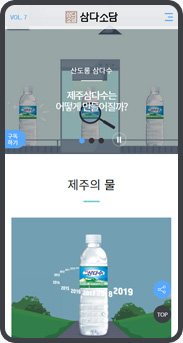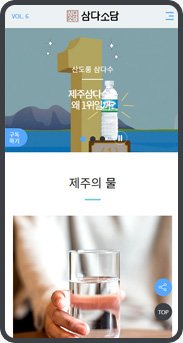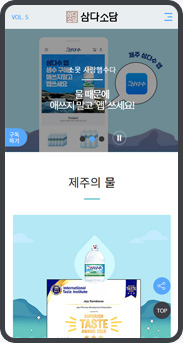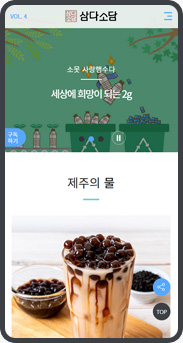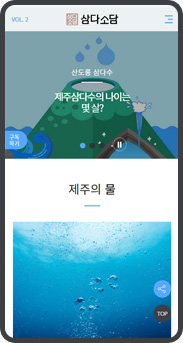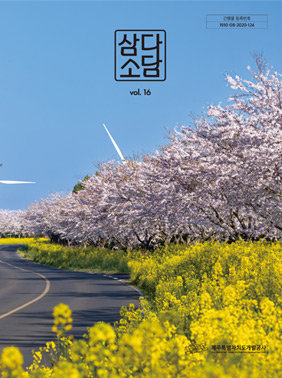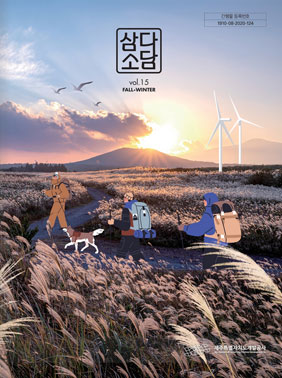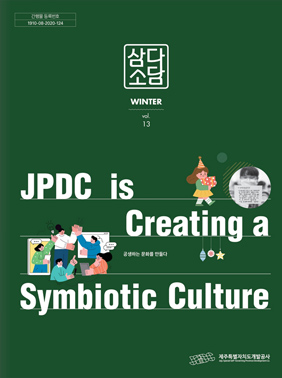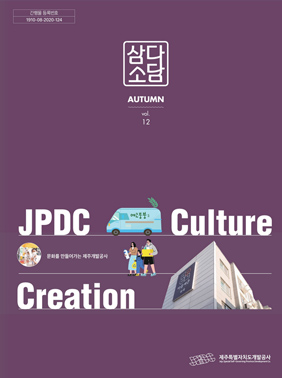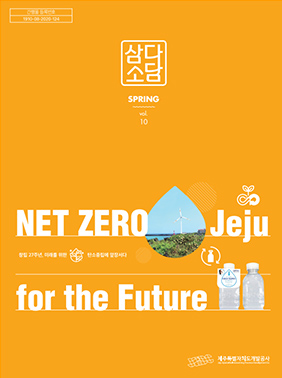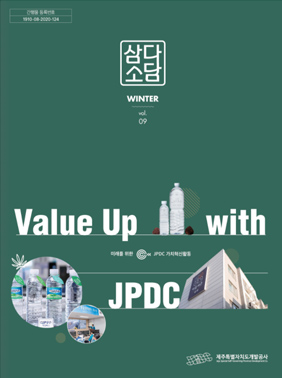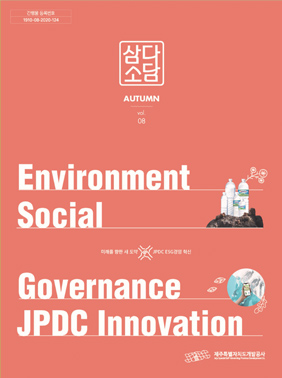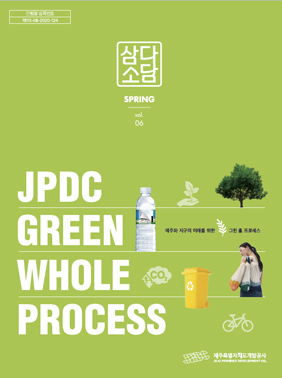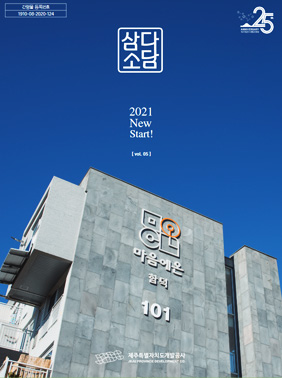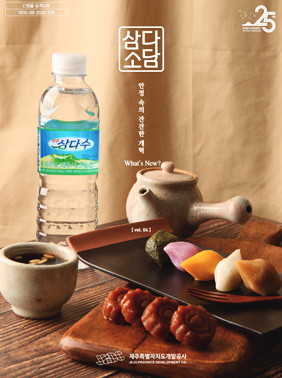삼진소담 홈
홈제주쿰다(제주를 품다)제주 문화 돋보기
제주 문화 돋보기
제주도 출생의례
임신과 출산 문화
출생의례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을 기원하거나 태어난 생명을 무탈하게 키워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의례를 말한다.
제주도 역시 아이를 가지기 위한 장소와 미신 등 전해져오는 전통이 있으며 지역만의 출산의례도 존재한다.
제주도 역시 아이를 가지기 위한 장소와 미신 등 전해져오는 전통이 있으며 지역만의 출산의례도 존재한다.
글편집실
참고자료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출산의례’(http://jeju.grandculture.net), 일생의례사전(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4.),
제주의 민속(제주: 제주도, 1993.), 제주의 민속문화 6 제주인의 일생(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아이를 가지기 위한 의례, 기자의례
제주도의 한라산 영실, 아흔아홉골, 성산읍 오조리의 식산봉, 가파도의 개미왕들, 대정의 산방산 등은 자식을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유명한 장소들이다. 이곳에서 치성을 드리면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기자의례는 일정한 대상에 치성을 드리는 치성 의례와 유별난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먹음으로써 그 주술성에 의존하는 속신 의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치성 의례는 절에서 하는 불공, 명산대천 치성, 집안에서 올리는 치성, 심방을 불러서 치러지는 불도맞이 굿 등이 있다. 불도는 아이의 잉태부터 출산까지 관장하는 산신으로, 불도맞이를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혼인 후 자식이 없거나 딸만 낳으면 본인 또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당이나 절에 가서 빌면서 ‘생남기도’를 하기도 했다.

↑아흔아홉골

↑대정의 산방산
주술성에 의존하는 속신 의례의 예로는 ‘새벽에 동쪽으로 뻗은 백일홍 꽃가지를 꺾어서 달여 먹는다. 이 때 동쪽을 향하여 절하면서 먹어야 한다.’, ‘태낭(애기방석)을 태워서 그 잿물을 먹는다.’, ‘수탉의 생식기를 삶아서 먹는다.’ 등이 있다.
육지에선 아이를 낳기까지 산모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도 부지런히 일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길에서 낳은 아이에게는 ‘길둥이’ 혹은 ‘질둥이’, 축항에서 출산했을 경우 ‘축항둥이’, 배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배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육지에선 아이를 낳기까지 산모가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도 부지런히 일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길에서 낳은 아이에게는 ‘길둥이’ 혹은 ‘질둥이’, 축항에서 출산했을 경우 ‘축항둥이’, 배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배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출산의례
예전에는 동네에서 출산을 잘 돌보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집에서 출산을 했다. 그래서 분만일이 다가오면 출산을 도와줄 산파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제주도에선 산파를 삼승할망이라고 불렀다. 출산 준비물로는 시어머니는 봇뒤창옷(배냇저고리)과 아기구덕, 아기담요, 친정어머니는 아기이불과 뚜데기를 사주는 풍습이 있었다.
아들을 절실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아들을 여럿 낳은 집에 가서 봇뒤창옷을 빌려오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봇뒤창옷을 입어야만 하나의 인격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빌려서라도 꼭 입혔다.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찾아왔다고 한다.
아들을 절실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아들을 여럿 낳은 집에 가서 봇뒤창옷을 빌려오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봇뒤창옷을 입어야만 하나의 인격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빌려서라도 꼭 입혔다.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찾아왔다고 한다.

↑ⓒ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 봇뒤창옷(배냇저고리)
출산 후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태반 처리와 산모의 음식, 아이 옷 입히기 등의 의례가 이루어졌다. 태반을 처리하는 것은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뚜껑이 있는 그릇에 넣어 뚜껑을 닦아 남몰래 바다에 가서 던지는 것이다. 만약 뚜껑에 틈이 생겨서 개미에게 태를 물어 뜯기게 되면 아이가 부스럼이 난다고 믿었다. 두 번째는 삼살방이 아닌 방향으로 나가 세 갈랫길 한가운데서 태반을 장작으로 태우는 것이다. 태우고 남은 재는 태독약으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마지막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다. 이때에도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아 묻어야 한다. 태반을 묻고 3년 후에는 간질병이나 폐병환자에게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하시는 독자분들에게
매월 흥미롭고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매월 흥미롭고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구독신청을 취소하시려면 아래 [구독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취소 신청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취소 신청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VOL.46 Ma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