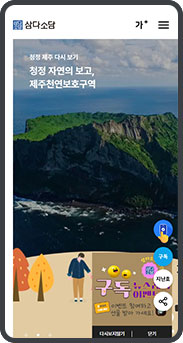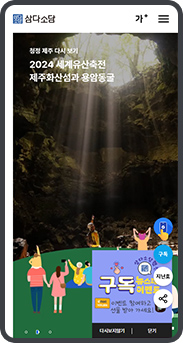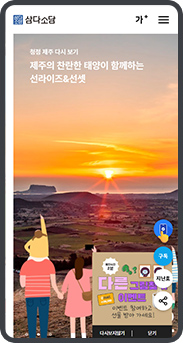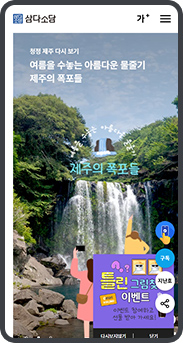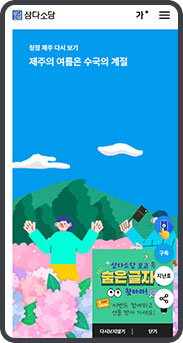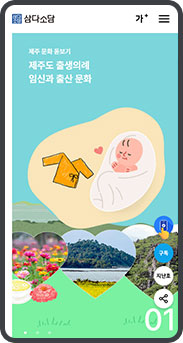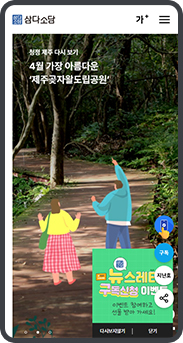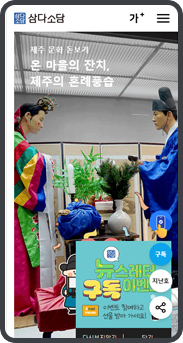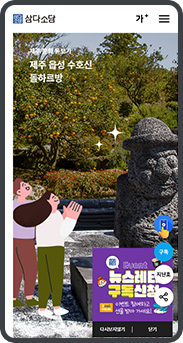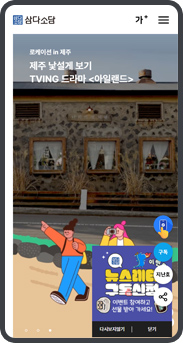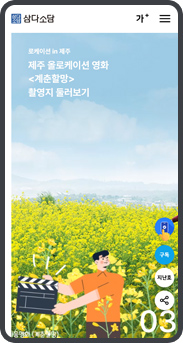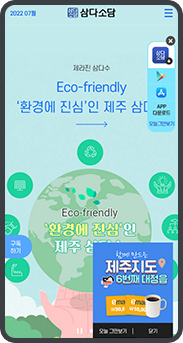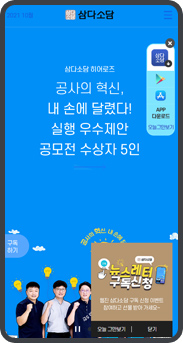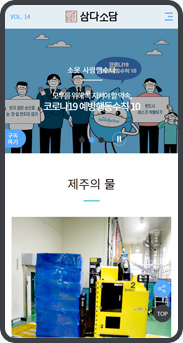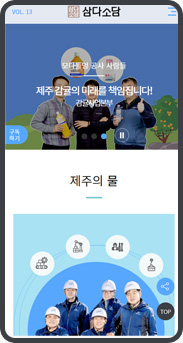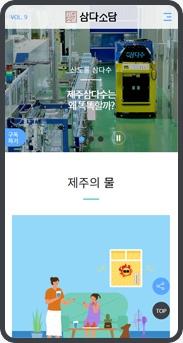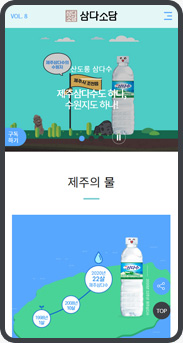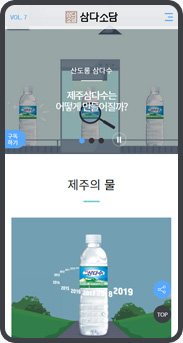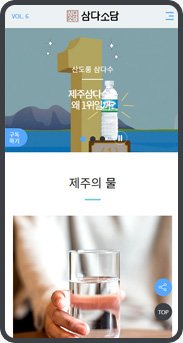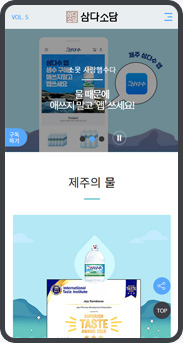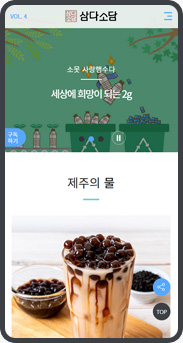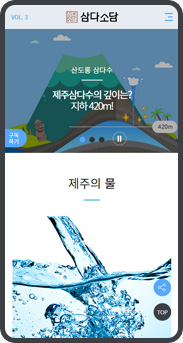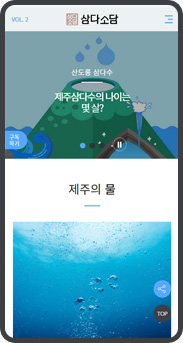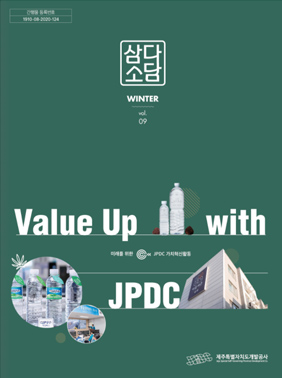보기
흐르는 제주 나들이
- 아픈 역사의 흔적 제주 최초의 비행장, 알뜨르 비행장
- 송악산, 단산, 모슬봉, 산방산 아래쪽 뜰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은 곳이며, 정뜨르 비행장과 함께 대표적인 일제의 군사시설이다.
- 글. 사진 김용석 사내기자
일제강점기,
전쟁의 전초기지로
워낙 평평한 대지라 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곳은 없지만, 앞에 있는 산방산과 멀리 한라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곳은 서귀포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이다. 알뜨르 비행장은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예전 지명 : 정뜨르 비행장)보다 먼저 생긴 제주도 최초의 비행장이다. ‘마을 아래의 너른 벌판’이라는 뜻을 가진 알뜨르 지역에 생겨 ‘알뜨르 비행장’으로 명명되었다. 이 비행장은 1933년 일제강점기 때,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중국 침략을 위해 만든 ‘불시 착륙장’으로 일본 해군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이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전 6만평 규모에서 20여 만평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때부터 중요한 군사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1937년 중국 난징(南京)에 대한 도양폭격(渡洋爆擊)을 하고 돌아오는 폭격기들의 기착점으로 활용되었다. 1941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미군의 B29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공습하는 것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 모슬포 지역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보다 단단하게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 80만평 규모로 비행장을 증축할 계획까지 세웠었지만 1945년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미완의 공사로 남게 되었다.
온전히 남아있는
강제징용의 흔적들
알뜨르 비행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비행기의 격납고다. 아직도 29개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당시 두꺼운 콘크리트의 돔을 반쯤 가른 모양을 한 지붕에 흙을 덮어 위장한 모양새를 갖춰, 비행장 상공에서는 격납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
알뜨르 비행장의 격납고를 가까이 가서 보면, 울퉁불퉁 어지러이 미장되어 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몽글한 자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모슬포 해변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약 10년간 모슬포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징용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흔적들 역시 그 당시 강제노역으로 고초를 겪으며 희생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행기 격납고에서 활주로 쪽으로 50미터 정도 가다 보면 비행장의 관제탑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그 당시 비행부대 지휘소 또는 통신시설로 사용된 일제 지하벙커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지하벙커 안으로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어둡고 음습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가 보았다.


입구는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성인이 서 있어도 넉넉히 남을 만큼 높은 층고와 10여 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나왔다. 지하실 특유의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그리고 음산한 적막감으로 가득 찬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알 수 없는 일본말과 레이더의 어지러운 신호음으로 가득했을 것을 떠올리니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감회에 젖는 것도 잠시, 사방팔방 그물처럼 자리 잡은 거미줄과 이름 모를 벌레들의 무차별 공격에 혼쭐이 나 도망치듯 지하벙커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며 출구로 나와 정면을 바라보니, 잡초들로 무성한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진다. 저 멀리 석양이 밀물처럼 드리우고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잡초들의 물결이 지금은 평화로이 보이지만, 그 옛날 저 하늘을 수없이 날아올랐을 비행기들의 굉음 사이로 무고하게 스러져간 분들의 넋을 위로해드리고 또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삼다소담 웹진 구독취소
[구독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