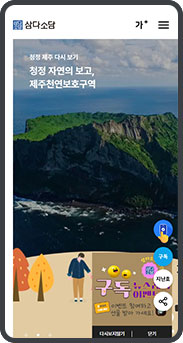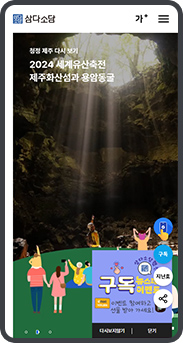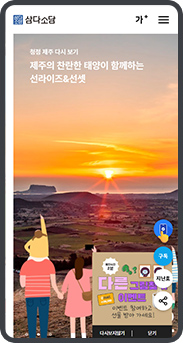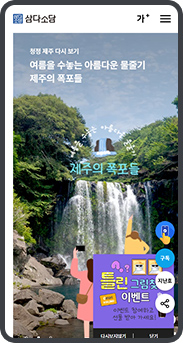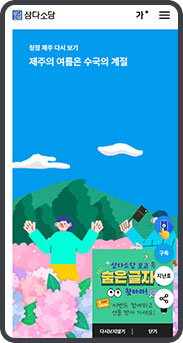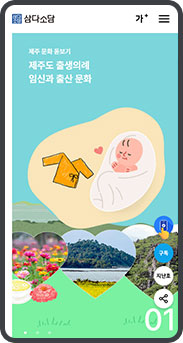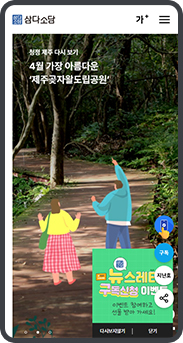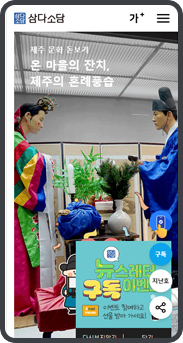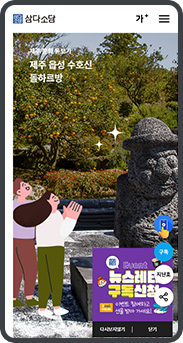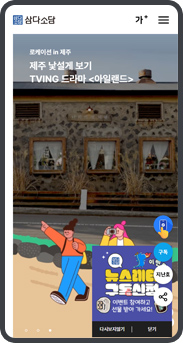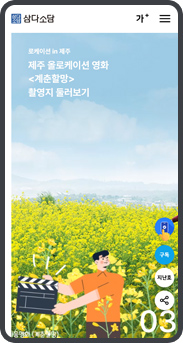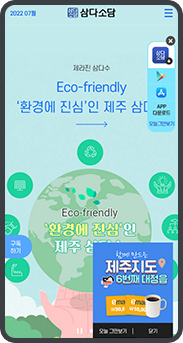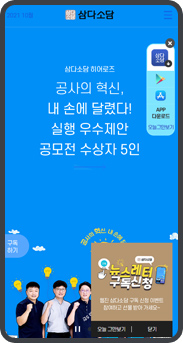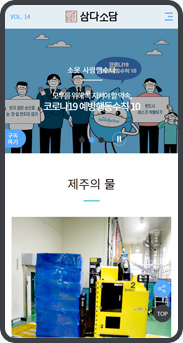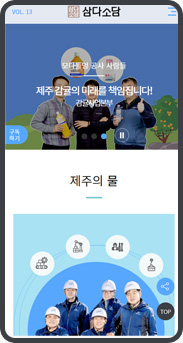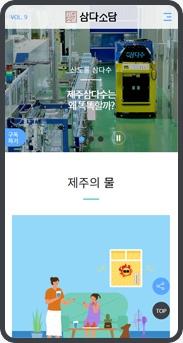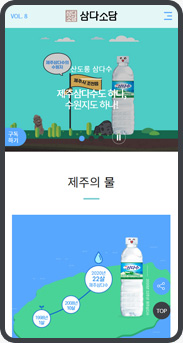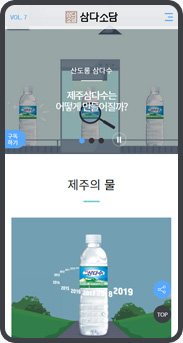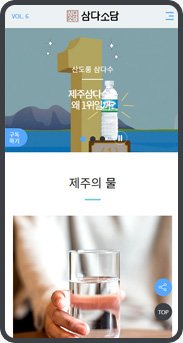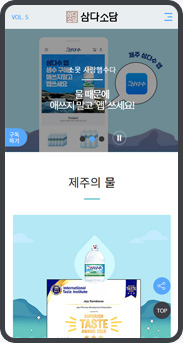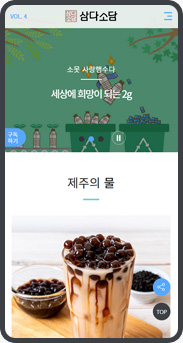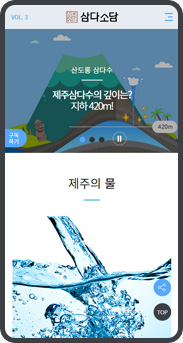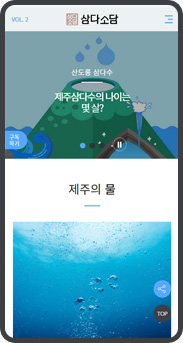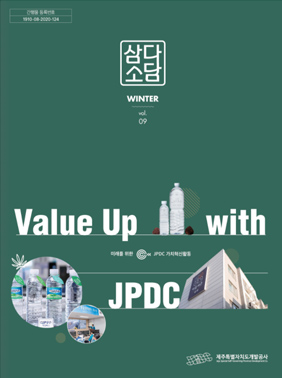보기
제주물 돋보기
- 바닷가에 남탕, 여탕이 있다? 용천수 물통
- 독특한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독자적인 풍습과 문화를 가진 제주. 물이 귀한 환경인 만큼 물과 관련된 풍습과 문화가 다양하다.이번 호에는 물을 아껴 쓰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제주 용천수 물통에 대해 알아본다.
- 글. 편집실, 사진.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바닷가에 ‘탕’이 있는 이유는
제주의 바닷가에는 재미있는 풍경이 있다. 물을 가두어 둔 검은 현무암 담에 ‘남탕’, ‘여탕’이라고 표시해둔 모습이다. ‘탕’이라 하니 몸을 씻는 곳임은 분명한데, 왜 굳이 바닷가에 만들어둔 것일까?
이는 용천수가 풍부하게 솟아나는 곳이 주로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이다. 제주의 지표면은 화산회토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거의 지표면 아래로 숨어들어간다. 빗물은 지하의 용암층을 흘러내리다가 바닷가에 와서야 솟아오른다. 제주 용천수의 90% 이상이 해안가에 있는 이유다. 제주 사람들은 용천수를 ‘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살아 샘솟는 물(용천·湧泉)’이란 뜻이다.

물을 보호하고 절약하는 지혜가 담긴 물통
이 용천수를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돌로 만든 ‘물통’이다. 용천수가 나는 곳에 돌을 쌓아올려 마을의 공동 물통을 만드는 것은 물론 흐름에 따라 몇 칸으로 나눠서 썼다. 상류 쪽에 있어 가장 맑은 물은 먹는 물통, 그다음은 채소를 씻는 물통, 마지막은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물통 등으로 구분해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남탕은 하나의 물통으로 만들어 단순히 몸을 씻는 용도로만 썼지만 여탕은 보통 3~4가지 구조를 만들어 물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물통과 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든 물길, 물허벅을 놓을 수 있는 자리, 빨래하기 편하도록 한 자리 등을 만들어 용천수를 보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옛 물통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현대적인 형태로 복원된 곳도 많아 제주의 물 문화를 전해주고 있다. 지금도 곽지해수욕장에 있는 과물은 해수욕 후 몸을 씻을 수 있는 노천탕으로 이용되고 있다.


삼다소담 웹진 구독신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외의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삼다소담 웹진 구독취소
[구독취소] 버튼을 눌러주세요.